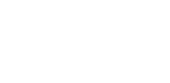테마
언제적 기억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갓 걸음마를 뗀, 정말 어렸을 때라는 건 분명하다.
빛의 쏟아지고 있었다.
아득한 머리 이 한 점에서 지엄하게, 그렇지만 아낌없이 평등하게 쏟아지는 고귀한 빛이,
세상은 밝고, 한 없이 넓고, 항상 흔들리며 쉽게 변화하는, 성스럽고도 두려운 장소였다.
달콤한 향기가 어렴풋이 풍겨왔다. 자연계 특유의 비릿한 풋내와 무언가를 태우는 단내가 발밑과 등 뒤에서 풍겨오는 가운데, 그 안에 역시 놓칠 수 없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살랑 살랑, 부드럽고 시원한 소리가 몸을 감싼다. 그것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농밀하고 생생한, 크고 작은 수많은 무언가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주변의 공기 속에 충만했다.
그것을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미 그것을 나타낼 표현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답은 목구멍까지, 바로 곁까지 다가와 있었다. 금방 그걸 나타낼 말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전에 새로운 소리가 머리 위로 쏟아졌고, 대번에 그쪽으로 관심을 빼앗겼다.
그렇다, 실로 소나기처럼, 하늘에서.
밝고 힘찬 음색이 세상을 흔들었다.
물결이기도 하고 진동이기도 한 무언가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울림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차분해졌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시절의 광경을 볼 수 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으리라
환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꿀벌은 세상을 축복하는 음표라고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지고한 음악이므로 가득 차 있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