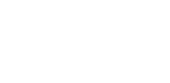언어의 온도 - 틈 그리고 튼튼함
대학 때 농활(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사엋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 스님인 듯 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식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석물石物은 수백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렇겠나 뭐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업싱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마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문학 > 언어의 온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어의 온도 - 그냥 한 번 걸어봤다. (0) | 2017.08.27 |
|---|---|
| 언어의 온도 - 말의 무덤, 언총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더 아픈 사람 (0) | 2017.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