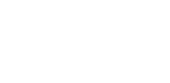언어의 온도 -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 암 환자가 들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히 퍼져 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이랏ㄴ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못브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음,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患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같은 호칭을 싫어하는 분도 많ㅇ나요 그래서 은퇴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한 마디가 의술醫術이 될 수도 있어요."
'문학 > 언어의 온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어의 온도 - 그냥 한 번 걸어봤다. (0) | 2017.08.27 |
|---|---|
| 언어의 온도 - 말의 무덤, 언총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틈 그리고 튼튼함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더 아픈 사람 (0) | 2017.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