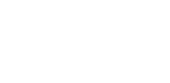언어의 온도 - 더 아픈 사람
언어의 온도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漁擄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항하는 어부처러 ㅁ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이ㅏㅂ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헝클어진 앞어미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낟.
그리고 아파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문학 > 언어의 온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어의 온도 - 그냥 한 번 걸어봤다. (0) | 2017.08.27 |
|---|---|
| 언어의 온도 - 말의 무덤, 언총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틈 그리고 튼튼함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0) | 2017.08.27 |
| 언어의 온도 -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0) | 2017.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