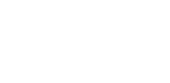우주만 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도어(안전문)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흘리개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어싿.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풀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시대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귓앳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려싿. "맞아,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이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려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롱무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 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